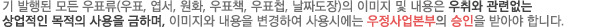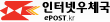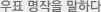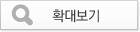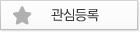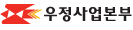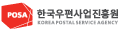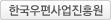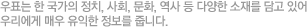
전통 생활문화 특별(여섯 번째 묶음) |
|
|---|---|
| 우표번호 | 2393 |
| 종수 | 4 |
| 발행량 | 560000 |
| 디자인 | 갓 |
| 인쇄 및 색수 | 요판 2도(팔각형 우표) |
| 전지구성 | 4×4 (4종연쇄) |
| 디자이너 | 모지원 |
| 발행일 | 2004. 8. 20. |
| 액면가격 | 190원 |
| 우표크기 | 35×35 |
| 인면 | 35×35 |
| 천공 | 13 |
| 용지 | 요판 원지 |
|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

"전통 생활문화 특별 마지막 발행인 여섯 번째 묶음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거나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쓰던 관모(冠帽)를 소개한다. 관모는 실용적·장식적·상징적 의미를 담아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우표에 소개된 관모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금관(金冠)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원단(元旦), 국경일, 대제례(大祭禮), 조칙의 반포 시에 조복(朝服)과 함께 착용하던 것으로 이를 금관조복이라고 한다. 금관의 모양은 원통형이고, 관 전면의 머리둘레 부분과 후면 전체에 당초무늬를 하였으며, 여기에 금칠을 하고 나머지는 흑색이었다. 여기에 목잠(木箴)이라는 관을 가로지르는 비녀가 있어 그 목잠에도 금칠을 하였다.
패랭이
대나무 가지로 성글게 엮어 만든 패랭이는 조선 초기에 흑립(갓)이 양반층의 전유물이 되면서 역졸, 보부상, 백정 등의 신분이 낮은 이들이 착용하거나 상복(喪服)으로서 상주(喪主)가 외출 시에 두건 위에 쓰기도 하고 비 오는 날 착용하기도 하였다. 역졸은 흑칠한 것을 쓰고, 보부상은 패랭이에 주먹크기 만한 목화송이를 얹어 썼다.
사모(紗帽)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문무백관이 평상복에 착용하던 관모로 서민들도 혼례 때에는 사모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사모는 뒤가 높고 앞이 낮아 중간에 턱이 진 형태로 뒷면에는 좌우로 각(角)을 달았다. 겉면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에 얇은 비단을 덮었다.
갓
세죽사(細竹絲)나 말총으로 만드는 갓은 조선시대를 이어 내려온 대표적인 관모로, 흑립(黑笠)이라고도 불리며, 조선 초에는 백관 조복(朝服)에 사용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사대부와 서민의 통상 관모로 말엽까지 착용되었다. 갓끈을 맬 때 다는 정자(頂子)를 백옥 정자, 수정 정자 등으로 다르게 하여 그 사람의 직품을 나타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