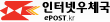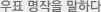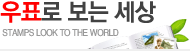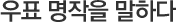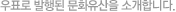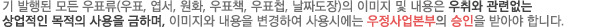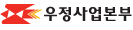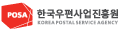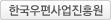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습,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인간들의 삶을
담고 있는 지도가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
지만, 동굴이나 바위, 또는 조개 따위에 그려 낸 그들의 모
습이나 약속 장소를 그림이 아닌 지도라고 볼 때, 지도 제
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
의 사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의 고전이자 고지도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
들에게 알려진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 간행된 대
축척 분첩절첩식 전국지도이다. 1861년에 신유본이 처음
간행되었고, 1864년 일부분을 수정하여 갑자본을 간행하
였다. 1898년 일본이 조선 침략의 기초 단계로 경부선을
부설하면서 측량 기술자 60명과 한국인 2~300명을 비밀
리에 고용하여 1년간 조선을 샅샅이 뒤져 5만분의 1 지도
300장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가 대동여지도와 큰 차
이가 없어 감탄했다고 전한다. 일제의 한국 토지 측량에 대동여지도를 사용하였다는 이 일화와 청
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
는 대동여지도의 정확성과 훌륭함을 전하
는 증거로 널리 전해 오고 있다.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에는 일본 육군에서 군사지도(兵
圖)로 사용하였던 대동여지도가 보관되어
있어, 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지도의
발달사를 집대성하고 있는 『지도학사(The
History of Cartography)』 시리즈(총 8권)의
한국편(Volume 2, Book 2) 서술 <한국의 지리학(Cartography in Korea)>에서도 대동여지도는 우리
나라 고지도,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리학의 대명사로 인정
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대동여지도 가운데 총 3종이 보물로 지정되
어 있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50호), 서울역사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50호-2)은 신유본이며, 서울대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보물 제850호-3)은 갑자본이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은 22층의 전도뿐만 아니라 1층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지도의 제작 경위를 밝힌 지도유설과
지도 축척의 기준을 제시하는 도리표, 지도에 사용된 기호
를 정리한 지도표(地圖標), 그리고 서울의 도성도(都城圖)
와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 등의 보존 상태가 훌륭하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국토 전
체를 120리 간격으로 나누고(22층), 각 층에 해당하는 지
역의 지도를 연결, 아코디언처럼 펼쳐 볼 수 있도록 각
각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
준으로 병풍과 같이 접고 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다. 22층을 모두 연결한 대동여지도는 세
로 6.6m, 가로 4.0m(1첩 평균 크기 세로 30.6cm, 가로
20.1cm)에 이르는 대형 지도가 되어, 적어도 3층 높이 이
상의 공간에 전시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지도에 축척을 명시한 축척지도이며, 경위
선표식 지도(經緯線表式地圖)이다. 경위선표식 지도란 비
교적 일정한 크기의 방안(方眼) 바탕에 축척을 적용하여
그린 지도를 말한다. 방안을 사용한 지도는 방안지도 또는
옛 문헌의 표현을 빌려 경위선표식 지도, 선표도(線表圖),
방안좌표지도(方眼座標地圖) 등으로 불려 왔다. 경위선표
는 현대 지도에서의 경위도좌표가 아닌 단순한 가로세로
의 눈금선을 뜻하며, 17세기 후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위선표식으로 지도를 많이 제작하였다.
그러나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 이전 지도에서는 볼 수 없
었던 방식으로 축척을 표시하였다. 김정호는 지도 위에 일
일이 방안을 그리는 대신 대동여지도 1책에 원고지 모양
(가로 8개, 세로 12개로 구성)의 ‘방안표(方眼標)’를 수록하
였다. 원고지 작은 사각형 하나인 한 개의 눈금에는 ‘매방
(每方) 10리’라고 기록해 놓아 눈금 하나가 10리임을 명시
하고 있다. 또 ‘매편(每片) 종(從) 120리 횡(橫) 80리’라고
기록하여 지도 한 면(片)의 동서 길이가 80리, 남북 길이
가 120리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축척은 지도 내용 속에도
표시되어 있다. 즉, 도로 위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나
타낸 것이다. 이러한 거리, 축척 표시 방법은 대동여지도
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형에 따라 10리마
다 찍힌 점의 간격이 다른데, 이는 축척을 나타냄과 동시
에 지형적인 조건을 알려 주는 것이다. 즉, 직선으로 표시
된 대동여지도의 도로가 지역과 지역 사이의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상의 거리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목판으로 간행
한 목판본 지도, 즉 인쇄본 지도라는 점이다. 목판 지도는
지도의 보급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대축척 대동여지
도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목판본 전국지
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을 것이다. 내용상의 풍부함 외
에도,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선명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로와 하천 표기가 매우 정밀하며 글
씨와 기호는 정돈되어 있고, 힘찬 산줄기는 명료하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대동여지도의 우수함은 다른 어느 지도도 따를 수가 없다.
대동여지도는 회화적 기법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
식까지도 담아냈다. 이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한 것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산줄기의 표현은 산의 크기(높이)와 중
요도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가 있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대간, 대간에서 갈라져 나가 큰 강을 나누는 정맥(正脈).
정맥에서 갈라져 나가 큰 내를 이룬 줄기순으로 굵기 표현
에 차등을 두었다. 이는 산줄기의 위계에 따라 산의 굵기
를 달리한 것으로, 조선 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산천에 대
한 인식 체계가 지도 위에 반영된 것이다. 당대인들의 국
토관, 세계관 등이 담겨져 있어 지도의 사상적인 중요성
을 보여 준다. 또한 백두산, 금강산의 경우 다른 산들에 비
해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왕릉의 경우에는 풍수나 묏
자리를 그린 산도(山圖)에서 보이는 방법과 유사하게 산맥
이 능(陵)을 감싸 안은 듯 표현하여 당대에 제작되었던 회
화식 지도의 모습을 지도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을 알 수 있
다. 동시에 당시 조선인들의 사상을 사실적 지리 정보와
함께 지도 상에 묘사하고 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는 11,500여 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
다. 이는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당하는 ‘지도표’를 고안하
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동여지도 가장 상단인 제1층
에 수록된 지도표는 지표상의 각종 현상을 14개 항목 22종
의 기호로 표시하였다. 이는 능·역·창고·산성·진보·고현(古
縣)·방리(坊里) 등의 경우 지명에서 공통되는 어미를 생략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
는 방법인 동시에 목판에 판각해야 하는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동여지도에는 지도를
제작할 당시 지표상의 주요 현상은 물론 옛 현(縣), 옛 진
보, 옛 산성 등 현재에는 이미 사라진 역사적인 흔적까지
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위성지도를 제작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대동여지도의 정
확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지도 제작 기술과 정확도
만이 지도의 가치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대동여지
도는 조선시대 지도 제작 기술의 집대성일 뿐만 아니라 당
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
는 역사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대동여지도는 그 자체만
으로 충분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다
[월간 우표 발췌]
* 모든 이미지와 콘텐츠는 원작자 및 발행처에 저작권이 있으며, 무단 도용시 법적 제재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