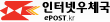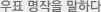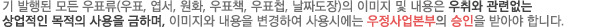신문이나 방송이 없던 시절 백성들은 나라 안팎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을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나라 안팎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을
밖의 일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으며 살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신문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으나, 조선시대에도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매체가 있긴 있었다. 이름하여 조보(朝報). 관청에서 발행하여 각 관청에 배포했으며 그 내용
또한 관청에 관한 일이니 일종의 관보(官報)라 할 수 있다.
조보의 기사를 제공한 관청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承政院)이었다. 승정원에서
전날 내려졌던 왕의 명령이나 지시, 유생이나 관리들이 올린 상소문, 관리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게시하면 각 관청에서 나온 기별서리(寄別書吏)가 그대로 베껴 소속 관청에 보냈다.
게시하는 시간은 매일 오전이었다.
조보의 전달은 서울지역의 경우 기별군사(寄別軍士)가 맡았다. 때로는 조보를 베낀 기별서리가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조보를 전달받으면 각 관청에서는 필요한 만큼 더 베껴 주요 관리나 인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방관서의 경우,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경주인(京主人)이 베껴 자기 고을로 보냈다.
조보를 보는 사람은 그처럼 서울에 있는 각 관청이나 지방관청의 관리나 양반계층이었다. 일반 백성은
보고 싶어도 볼 길이 없었다.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조보는 조선이 개국한 뒤부터 발행되었다. 개국 초에는 ‘기별(寄別)’ 또는
‘기별지(寄別紙)’라 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사관이 조정의 결정 사항이나 견문록 등을 기록하여
각 관청에 돌렸다. 세조 때부터 ‘조보’라는 이름으로 승정원에서 취급하여 왕명이나 상소문, 관원들의
인사발령 등을 실어 서울의 각 관서나 지방관서, 상류계급의 인사들에게 돌렸다.
따라서 조보의 내용은 최고 통치자인 왕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유생이나 관리들이 올리는 상소문의
내용을 공개하고 상소문에 대한 국왕의 답변인 비답(批答)을 싣기도 했다. 중앙관서나 지방관서에서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올리는 각종 복명서와 보고서도 게재했다. 조보는 그처럼 상하간의 의사 소통의
통로로서, 민의 상달의 통로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다. 조선의 역대 왕은 조보 발행에 높은 관심을 가져
조보의 게재 사항이나 금지 사항을 직접 지시했으며, 특히 게재 금지 사항에 대해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조보의 배포 대상이 넓어졌다. 중종 시절인 1520년에는 사관이 조보를 필사하여 상공 관계자에게 배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뒤 1577년(선조 10년)에는 민간인이 조보를 인쇄하여 장사를 했다. 조보에 실린 글을 목판인쇄로 찍어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덕분에 조정의 배포 대상이 아닌 하급 관리나 일반인도 조보를 읽을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신문은 그렇게 탄생한 셈이었다.
그러나 활자로 찍어낸 신문은 오래 가지 못했다. 선조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며 금지시켰다. 국가 기밀이 이웃나라에 흘러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며 인쇄를 허락한 관리들을 귀양보내기까지 했다. 조정의 일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도 꺼렸겠지만,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욱 싫었던 모양이다. 때문에 목판인쇄는 개시한 지 몇 개월 안 돼 중단되었다. 잘하면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조보의 꿈은 그렇게 무산되었다.
조보의 글씨체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랐다. 서울의 독자들이 보는 조보는 승정원에서 매일 한 번씩 발행했다. 순 한문으로 기록했는데, 이두식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필사본인 조보의 글씨체는 독특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을 베껴 써야 하기에 흘림체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읽는 조보는 정성을 들여 썼기 때문에 정자체에 가까운, 반듯한 글씨체로 쓰였다. 조보는 1894년 8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관보(官報)가 발행되면서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조보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관보는 1천년도 넘은 옛날부터 발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나라 때에는 ‘저보(邸報)’라는 명칭으로 중앙정부의 법령과 인사발령 등을 알렸고, 조선시대의 조보처럼 목판인쇄도 했다고 한다. 송나라 이후에도 그 같은 형식의 관보가 계속 발행되었다.
주요 관청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는 각 관청에서 기별서리와 기별군사를 보내 조보를 베껴 왔는데, 지방관청에서 조보를 전달받는 방식은 약간 달랐다. 지방관청에서는 파발을 이용해 조보를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주인제도를 이용했다. 경주인이란 조선시대 중앙정부와 지방관청간의 연락사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한 향리(鄕吏), 다시 말해, 아전을 일컫는 말이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감영이나 주, 현 등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했다. 따라서 각 지방관청은 서울에 연락사무소인 경저(京邸)를 두고 운영했는데, 그 같은 연락사무소를 맡아 운영한 사람이 바로 경주인이었다. 일명 경저리(京邸吏) 또는 저리(邸吏)라 불리기도 했다. 경주인제도는 고려 중기부터 조선말까지 계속된 것으로, 원래는 일정 기간 서울에 올라와 그 업무를 맡은 뒤 교체되곤 했으나,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경저를 운영했다. 경주인이 맡은 업무는 다양했다. 중앙정부와 지방관청 사이의 잡다한 일을 주선함으로써 연락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지방관을 견제하기도 했다. 주로 지방에서 차출하여 중앙으로 보내는 노비인 선상노 (選上奴)의 입역(入役)과 도망한 선상노의 보충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에는 공물의 상납 업무도 담당했다. 서울에 올라오는 관리나 군인들이 각 관청에 배치되어 종사할 때는 그들의 신변 보호를 맡기도 했다. 군역에 복무하던 자가 도망하거나 상번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관청간의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지방에서 보낸 각종 공납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납하는 책임도 졌다. 상경하는 지방민이나 관리들에게 잠자리와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경주인의 임무였다.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주인은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지방에서 상납하는 공납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지방에서 동원된 역 부담자가 도망하거나 제때 동원되지 못한 경우 고을을 대신하여 중앙관청에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고을에서 받아냈다. 알선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받아내면서 많은 폐단을 야기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각종 세력과 결탁하여 지방의 상납물을 먼저 납부하고 그 대가를 몇 배씩 받아냄으로써 많은 이익을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는 것은 실제로 공납물을 바쳐야 하는 농민이었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조선 정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주인으로 고용하고 오늘날의 월급에 해당되는 역가(役價)를 지급했다. 그러자 서울의 관리와 양반들이 그 자리를 매수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경주인 자리를 사고팔면서 고가로 매매되어 큰 고을의 경우 1만 냥까지 치솟게 되었다. 그처럼 권력기관으로 변질한 경주인이 맡게 된 또 하나의 업무가 조보의 전달이었다. 서울과 지방간의 업무 연락이 경주인의 임무이니 매일 발표되는 조보를 열심히 베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경주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보는 매일 게시되었으나, 지방으로 가는 조보는 매일 보낼 수 없었다. 원거리로 보낼 경우 십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일 보내려면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으로 가는 조보는 5일이나 10일 또는 1개월분을 모아 한꺼번에 보냈다. 경주인이라는 자리가 그처럼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의 수준이 정상적일 리 없었다. 다산 정약용은 영주인(營主人)과 함께 경주인을 나라 안의 큰 폐단으로 규정하고, 경주인 역가제도(役價制度)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인은 조선시대 감영에 파견되어 군ㆍ 현과의 연락사무를 맡아 보던 지방의 향리였다. “저리(邸吏)의 폐단은 향리보다 심하다. 내가 어릴 적에 경주인이라는 자를 보았는데, 모두 노예나 하천(下賤)으로서 무뢰하고 비천한 자였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로 이 기풍이 크게 무너져, 경주인 자리를 매매하는 값이 혹 8000냥이나 되며 영주인의 자리는 1만 냥에 이르기도 한다. 대개 그 역가가 날로 증가되어 전보다 100배나 되었는데, 이것은 이익이 100배요, 백성을 벗겨낸 물건이 100배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경저와 영저는 모두 포악하고 간사한 자가 차지하고, 기름진 관청의 아전과 권세 있는 가문의 청지기로서, 비단옷에 얼굴이 깎은 옥 같은 자가 곧 저리가 되었다.” 경주인은 그처럼 부정적인 인물로 비추었음에도 그들에 의한 “조령(朝令)의 지방 전달은 우체보다 더 빨랐으며 기강이 엄숙하였고 조령 전달을 지체없이 봉행하였다.”고 정약용은 그의 저서 경세유표에서 기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도 조보의 지방 전달은 경주인의 담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에 이르러 경주인에 의한 조보의 전달이 크게 지체되었다고 한다. 우역제도에 의한 조보의 전달이 더욱 빨라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주인이나 우역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한 조보 전달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1883년 한성순보를 발행한 통리아문 소속의 박문국(博文局)이 지방에서의 한성순보 구독료를 경주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성순보의 지방 배달도 경주인이 맡았을 것이며, 조보의 지방 전달 역시 경주인이 맡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주인의 통신 유통에 있어서의 역할이 크게 주목되며, 앞으로의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